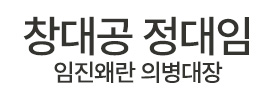창대정선생사적(昌臺先生年事蹟)
연보(年譜)
세종황제(世宗皇帝) 가정(嘉靖) 三十二년(明宗大王八年) 계축(癸丑:一五五三) 六월 四일 공(公)은 영천군(永川郡) 북쪽 명산리(鳴山里) 대전(大田)의 옛집에서 태어나셨다. 공(公)의 팔세조(八世祖)이신 판서공(判書公)이 영일(迎日)로부터 이사하여 영천군(永川郡) 남쪽 전촌(錢村)에 사셨고, 오세조(五世祖)이신 생원공(生員公)이 도 대전(大田) 제일봉(第一峯) 아래로 옮기셨다. ○태어나자 특이한 자질(資質)이 있었고, 용모(容貌)도 준정(峻整)하였으며, 공연히 울거나 웃지 않으니 보는 자(者)가 기특하게 여겼다.
三十六년 정사(丁巳:一五五七) 공(公)이 五세(歲)임. ○일찍이 여러 아이들과 더불어 장난치고 놀면 비록 나이가 비교적 많은 자(者)도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었다.
三十八년 기미(己未:一五五九) 공(公)이 七세(歲)임. 비로소 글을 읽었다. 날마다 가르침을 받고 능히 글의 뜻을 통달하고 이해하였고, 외우면 문득 잊지 않았다.
三十九년 경신(庚申:一五六O) 공(公)이 八세(歲)임. 숙조(叔祖)이신 현감공(縣監公)에게 수학(受學)하였다. 현감공(縣監公)의 휘(諱)는 윤식(允湜)이니 문행과 고상한 명망(名望)이 있었고, 조년(早年)에 국자(國子:成均試)에 선발되어 상(庠:成均館)에 올랐고, 진조(眞寶)와 봉화(奉化)의 두 곳 현감(縣監)에 제수(除授)되셨다. 공(公)의 제주와 지혜가 범상(凡常)하지 않음을 보고 기특하고 사랑하게 여기며 학과(學課)를 더욱 부지런히 권장하였고, 매번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가 후일(後日)에 반드시 큰 그릇으로 성장하여 우리 가문의 명성(名聲)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四十一년 임술(壬戌:一五六二) 공(公)이 十세(歲)임. ○공(公)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돌아가신 해가 보첩(譜牒)에 쓰여져 있지 않았다. 장노(長老 )들의 전하는 말씀에 十세(歲) 전에 일찍 부모(父母)님을 잃었다고 하였으나 지금 감히 적확(的確)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부서(附書)하면서 후일(後日)의 고찰(考察)을 기다리노라.
목종황제(穆宗皇帝) 용경원년(용慶元年) 정묘(丁卯:一五六七) 공(公)이 十五세(歲)임.
二년(宣祖大王 元年) 무진(戊辰:一五六八) 공(公)이 十六세(歲)임. 족형(族兄)이신 세아(世雅)를 자양정사(紫陽精舍)로 방문(訪問)하였음. 당시에 세아(世雅)가 자양정사(紫陽精舍)에 우거(寓居)하였으며 문학(文學)이 저명(著名)하다고 소문났다. 공(公)은 숙조(叔祖)님의 명(命)으로서 가서 문후(問候)하였던 것이다.
三년 기사(己巳:一五六九) 공(公)이 十七세(歲)임. 현감공(縣監公)의 상(喪)을 당하여 통곡하였다. 공(公)은 어려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은혜와 의리가 지극히 구비(具備)되었다. 상(喪)을 당하게 되자 비통(悲痛)함을 부친(父親)의 상(喪)과 다름이 없었다.
五년 신미(辛未:一五七一) 公이 十九세(歲)임. 부인(夫人)인 경주김씨(慶州金氏)를 맞이하였다. 참봉(參奉)인 건(乾)의 따님이었다.
六년 임신(壬申:一五七二) 공(公)이 二十세(歲)임. ○공(公)은 성품이 효성(孝誠)스러워 받들어 봉양(奉養)하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지극히 애통(哀痛)히 여겼다. 이미 결혼(結婚)하게 되자 느낌과 사모(思慕)함이 더욱 간절하여 매년 절일(節日)이면 반드시 선친(先親)의 묘소(墓所)를 성묘하며 눈물을 흘렸고, 삼주(三周)의 기일(忌日)에 상례(喪禮)로서 처우하였고, 제사(祭祀)를 마치고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생일(生日)을 만나게 되면 또한 근심하며 즐거워하지 않았다.
신종황제(神宗皇帝) 만력 원년(萬曆元年) 계유(癸酉:一五七三) 공(公)이 二十一세(歲)임. 주서절요(朱書節要)를 강론(講論)하며 연구(硏究)하였다. 이보다 과거(科擧)에 달려갔으나 불리(不利)하자, 문득 슬픈 듯 말하기를 『유자(儒者)의 사업(事業)이 허다(許多)한데 어찌 달아나고 경쟁함을 힘쓸소냐?』라고 하고는,
五 년 정축(丁丑:一五七七) 公이 二十五세(歲)임. 가을에 삼귀(三龜)의 선묘(先墓)를 성묘(省墓)하고 곁에 흙을 쌓았다. 묘소 오른쪽에 바람이 쏘아 사초(莎草:잔디)가 번성하지 않아 공(公)이 친(親)히 스스로 영축(營築)하여 후환(後患)에 대비(對備)하였고, 별도로 토전(土田)도 설치하여 그것으로서 수묘(守墓)할 자산(資産)을 삼았다.
七년 기묘(己卯:一五七九) 공(公)이 二十七세(歲)임. 八월에 아들 양필(良弼)을 낳았음.
八년 경진(庚辰:一五八O) 공(公)이 二十八세(歲)임. 재종제(再從弟)인 대인(大仁)을 이끌고 함께 잠자고 거처(居處)하며 글을 읽었다. 공(公)은 일찍 부모(父母)를 잃고 형제(兄弟)가 적어 대인(大仁)을 어루만지고 사랑하기를 동기(同氣)와 다름이 없었으며, 길사(吉事)에 경축(慶祝)함과 우환(憂患)에 슬퍼함을 마치 자기의 몸에 있음과 같이 보았다. 이때에 이르러 아울러 일실(一室)에 거처(居處)하며 경사(經史)를 토론(討論)하고, 성력(星曆)이나 병진(兵陣)의 학설(學說)에 이르기까지 강론(講論)하고 연구하지 않음이 없었다.
十년 임오(壬午:一五八二) 공(公)이 三十세(歲)임. ○공(公)은 뜻이 크고 기개가 있었으며 기인한 절의도 있었고, 의(義)로서 베풀고 급한 자를 구원하기를 좋아하여 혹 곡간에 저장된 것을 기울여 향리와 이웃을 돕기도 하였고, 조사(弔事)나 경사(慶事)의 예(禮)도 빠트림이 없었으며 비록 하인(下人)이나 천인(賤人)의 상(喪)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고기반찬을 물리치셨다. 항상 떠돌아다니는 걸인(乞人)이 문에 이르음이 있었고, 매우 춥고 굶주리자 옷과 밥을 먹던 것을 주니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식구는 사랑하지 않는다.』 고 조롱하니 공(公)은 다만 웃으며 받아드릴 뿐이었다.
十一년 계미(癸未:一五八三) 공(公)이 三十一세(歲)임. 二월에 아들 양보(良輔)를 낳았다. ○인봉산(印峯山) 아래 못[저수지]를 쌓았다. 못은 삼귀(三龜)의 선영(先塋) 아래에 있었으니, 대개 만년(晩年)에 쉬지 않고 공부하려는 계획이었으며 거주하는 백성들이 그것을 힘입어 전답에 물을 대며 지금도 칭송한다.
十二년 갑신(甲申:一五八四) 공(公)이 三十二세(歲)임. 터를 잡아 두류봉(頭流峯) 아래 창대(昌臺)에 서사(書社)를 지었다. 명호(鳴湖)의 상류(上流)에 있으며, 좌우(左右)에 언덕과 계곡이 아늑하고 깊숙하며 시원하게 더웠는데 드디어 조그마한 서실(書室)을 열어 깃들어 살 장소로 삼으셨다.
十三년 을유(乙酉:一五八五) 공(公)이 三十三세(歲)임. 모춘(暮春:三月)에 족형(族兄)이신 세아(世雅)가 내방(來訪)하였다. 머물러 자면서 강론(講論)하고 인하여 붙잡고 못 가게 하여 명호(鳴湖)와 활연(活淵)의 사이를 유람하였다.
十六년 무자(戊子:一五八八) 공(公)이 三十六세(歲)임. 가을에 오천(烏川)으로 가서 사당(祠堂)에 배알(拜謁)하고 영일(迎日)과 흥해(興海)의 바다를 관람하였다. 감탄하며 김백암(金白岩)의 「배를 불러서 동쪽으로 노중련(魯仲蓮)의 나룻터를 물었네.」라는 구절(句節)을 외우며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즉 노중련(魯仲蓮)의 나룻터일까?』라고 하시고)는 드디어 그 운(韻)으로 차운(次韻)하여 시(詩)를 지으셨다. ○시(詩)는 잃어버렸음. 돌아오는 길에 옥산(玉山)을 방문(訪問)하여 회재 (晦齋) 이선생(李先生)의 사당(祠堂)에 배알(拜謁)하였다.
十七년 기축(己丑:一五八九) 공(公)이 三十七세(歲)임. 九월에 아들 양우(良佑)를 낳았다.
二十년 임진(壬辰:十五九二) 공(公)이 四十세(歲)임. 四월 十三일에 왜구(倭寇)가 대거(大擧) 갑자기 이르러 연이어 열읍(列邑)이 陷落)되고 전진하며 경성(京城)을 핍박하자 대가(臺駕)가 서쪽으로 피난하였다. 공(公)은 변란(變亂)의 소문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의병(義兵)을 일으켰다.
당시에 팔로(八路)가 기와가 깨지듯 산산히 흩어지자 공(公)은 분연(奮然)히 적개(敵愾)의 뜻이 있으시어 대인(大仁)과 더불어 앞장서서 의병(義兵)을 모집하니, 향인(鄕人)인 조희익(曺希益)과 조성(曺珹)과 이번(李蕃)과 조덕기(曺德騏)와 신준룡(辛俊龍)과 정천리(鄭千里)와 유몽서(柳夢瑞) 등이 모두 메아리처럼 호응(呼應)하였다.
당시에 족형(族兄)인 세아(世雅)는 군사를 피하여 기룡산(騎龍山)에 있었는데, 공(公)이 창을 잡고 활을 겨드랑이에 끼고 대인(大仁)을 거느리고 가서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기를 『군부(君父)가 피난을 떠나는데 어찌 우리들이 이씨(李氏)의 곡식을 먹으며 차마 초망(草莽)의 사이에서 목숨을 아끼겠습니까? 바야흐로 적(敵)에게 달려가 한 번 죽고 싶지만 같이 일할 사람이 없으니 어찌합니까?』라고하자, 세아(世雅)가 손을 잡으며 말씀하기를 『동생의 말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공적(公的), 사적(私的)으로 다행이로다.』라고 하고는 드디어 아들인 의번(宜蕃)과 더불어 종군(從軍)하였다.
군(郡)의 남쪽 추평(楸坪)에 모여서 맹세하고 여러 의사(義士)들이 공(公)을 추대(推戴)하여 의병대장(義兵大將)을 삼았다. 향리(鄕里)의 의사(義士) 六十여인(餘人) 및 문무인(文武人)의 모병(募兵)에 호응한 자(者) 수백인(數百人)이 공(公)을 추대하여 대장(大將)을 삼았고, 조성(曺珹)과 조덕기(曺德騏)와 이예(李枻)와 김호(金浩)를 차장(次將)으로 삼았으며, 정세아(鄭世雅)와 정담(鄭湛)으로 찬획종사(贊劃從事)로 삼았다.
이번(李蕃)과 정천리(鄭千里) 등을 보내 본군(本郡)의 군수(郡守)인 김윤국(金潤國)을 달래어 돌아왔다. 이보다 앞서 김윤국(金潤國)이 성(城)을 버리고 도망하여 묘각사(妙覺寺)로 들어가니 병사(兵士)와 백성들이 흩어지고 어수선하여 통솔함이 없기에 공(公)이 이번(李蕃) 등을 보내어 성(城)을 지키며 같이 죽자는 뜻으로 달래며 말씨가 매우 격앙되고 절박하니 윤국(潤國)이 부끄러워 사죄(謝罪)하고 돌아와 공(公)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힘을 합칠 것을 요청하였다.
五월에 정천리(鄭千里)로 하여금 달려가서 좌병사(左兵使)인 박진(朴晋)에게 보고(報告)하였다. 박진(朴晋)이 크게 칭찬과 감탄을 더하며 곧장 복병장(伏兵將)의 직첩(職帖)을 부치자 휘하(麾下)의 군사인 신준룡(辛俊龍)이 성을 내며 말하기를 『군관(軍官)의 임무(任務)가 어찌 서생(書生)에게 합당하랴!』라고 하기에, 공(公)이 말씀하기를 『국가를 위하여 적(賊)을 토벌하는데 편비장(楄裨將)인들 무엇이 욕(辱)될소냐?』라고 하고는 드디어 이번(李蕃) 등으로 하여금 난으로 도망간 백성을 수색(搜索)하여 정밀(精密)한 병사(兵士) 수백인(數百人)을 얻어 몸을 바쳐 순국(殉國)하자는 뜻으로 달래니 감격하여 눈물이 나오고 인심을 솟구치고 감동하게 하니 十일과 한 달의 사이에 무리가 九百여인(餘人)에 이르렀다.
六월에 초유사(招諭使)이신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에게 상서(上書)하여 절제사(節制使)를 받들기를 요청하였다. 당시에 박진(朴晋)의 듯은 꺼리면서 자못막고 억제하니 사졸(士卒)들이 모두 실망(失望)하기에 공(公)은 조희익(曺希益), 곽회근(郭懷瑾) 등과 더불어 초유사(招諭使)의 진영(陣營)에 상서(上書)하여 극진히 그 형상을 진정(陳情)하였고, 절제사(節制使)를 받들기를 원하자 김공(金公)이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다. 그제서야 모든 읍(邑)의 의장(義將)에게 명(命)하여 각각 그 군중(群衆)을 통솔하고 그 절제(節制)를 엄하게 하였고, 공(公)은 명을 받들고 군중(群衆)을 어루만지며 호령(號令)함이 밝고 엄숙하였다.
七월 十四일에 박연(朴淵)에서 적(賊)을 만나 크게 쳐부수었다. 이보다 앞서 적(賊)이 사방(四方)에서 나와 백성들을 치고 재산을 빼앗기에 공(公)이 이번(李蕃) 등으로 하여금 정병(精兵) 백여인(百餘人)을 거느리고 봉천원(蓬川院)에 매복하게 하였고, 또한 정천리(鄭千里)로 하여금 성황봉(城隍峯)에 오르게 하여 적(賊)의 형세를 정찰(偵察)하여 적을 만나면 문득 무찔러 죽이게 하였다. 적(賊) 三百여인(餘人)이 서산(西山)과 시천(匙川)의 사이에 나타났다 숨었다 하기에 공(公)이 헤아리니 그들이 돌아가려면 당산(唐山)을 경유(經由)하겠기에 복병(伏兵)을 설치하고서 기다렸더니 이날 저녁에 적(賊)이 과연 이르렀던 것이다. 공(公)이 언덕에 올라 구부리고 쏘니 화살에 맞아 쓰러지지 않음이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적(賊)이 봉고어사(封庫御使)라고 사칭(詐稱)하며 군위(軍威)로부터 달리며 내려오기에 공(公)이 정담(鄭湛), 조희익(曺希益)과 더불어 급히 경예(輕銳)한 군사를 거느리고 박연(朴淵)에서 맞이하여 공격하니 크게 무찔렀으며 머리를 벤 것이 四十여급(餘級)이었고, 그들의 창검(槍劍)과 우마(牛馬)의 무리를 빼앗음은 헤아릴 수 없었다. 이로부터 아군(我軍)의 명성(名聲)이 크게 떨쳤던 것이다. 이 역사(役事)에는 신령의장(新寧義將)인 권응수(權應銖)와 의흥의장(義興義將)인 홍천뢰(洪天賚), 정응거(丁應琚), 박응기(朴應琪), 이온수(李蘊秀) 등도 역시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모였던 것이다. 와촌(瓦村)에서 추격(追擊)하여 또한 무찔렀다. 머리를 벤 것이 수백여급(數百餘級)이었고, 총통(銃筒)과 문서(文書)와 집물(什物)도 빼앗았다.
추평(楸坪)에 진지(陣地)를 나열하고 성(城)을 회복할 계획을 하고 크게 공격할 준비를 베풀었다. 적(賊)이 성중(城中)에 둔(屯)을 치고 항거하며 낮에는 빼앗아가고 밤에는 지키니 여러 장수(將帥)들과 더불어 모의(謀議)하여 말씀하시기를 『적(賊)은 연이어 패(敗)함에 겁을 먹어 순라(巡邏)하여 살핌을 매설(埋設)하지 못하고 또한 뒤에서 계속함도 없으니 가히 군사를 나누어 매설(埋設)하여 바람을 인하여 불을 놓으면 일거(一擧)에 무찔러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하시니,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옳습니다.』라고 하였다.
계획을 정하고는 열읍(列邑)의 의병(義兵) 진지(陣地)에 통고(通告)하였더니 그제서야 권응수(權應銖)와 홍천뢰(洪天賚)와 경산의장(慶山義將)인 최대기(崔大期)와 자인의장(慈仁義將)인 최문병(崔文炳)과 하양의장(河陽義將)인 신해(申海) 및 경주판관(慶州判官)인 박의장(朴毅長)과 신령군수(新寧郡守)인 한척(韓倜)과 하양군수(河陽郡守)인 조윤신(曺胤申) 등이 기약(期約)한 날에 와서 모여 드디어 공(公)을 추대하여 대장(大將)을 삼고, 권응수(權應銖)로서 좌별장(左別將)을 삼았으며, 신해(申海)는 좌총장(左摠將)을 삼았고, 최문병(崔文炳)은 우총장(右摠將)을 삼았으며, 홍천뢰(洪天賚)는 전봉장(前鋒將)을 삼고, 김윤국(金潤國)은 우별장(右別將)을 삼았으며, 정담(鄭湛)과 정세아(鄭世雅)는 찬획종사(贊畫從事)로 삼고는 공(公)이 군졸(軍卒)로 하여금 미리 가시와 잡초를 구하게 하여 몰래 서북문(西北門) 밖에 쌓게 하고는 목책(木柵)으로서 긴 사닥다리를 얽어매어 성(城)을 넘어가는 도구(道具)로 삼았다.
二十七일에 공(公)이 열읍(列邑)의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능히 본군(本郡)을 회복(回復)하였다. 공(公)의 군사들은 엄한 군율(軍律)로 정돈하고 전일(前日)에 계획하였던 방략(方略)으로서 영(令)을 펼치며 말씀하시기를 『감히 어기는 자는 목을 베리라.』고 하셨고, 권응수(權應銖)와 약속하며 말씀하시기를 『적(賊)이 너의 문(門)을 범(犯)하면 내가 너를 목벨 것이고, 나의 문(門)을 범(犯)하면 네가 나를 목 베어라.』고 하고는 인하여 권응수(權應銖)와 조윤신(曺胤申)과 박의장(朴毅長)과 홍천뢰(洪天賚)와 최문병(崔文炳)과 신해(申海)로 하여금 서북문(西北門)을 포위하게 하고, 공(公)은 김윤국(金潤國)과 이번(李蕃)과 정천리(鄭千里)와 정세아(鄭世雅) 등을 거느리고 곧장 동남문(東南門)을 충돌하며 사면(四面)에서 북을 치며 진격하니 소리가 천지(天地)에 진동하고 화살과 돌이 비오는 것 같으니 적(賊)은 능히 지탱하지 못하여 담장의 벽에 의지하여 달아나기에 공(公)은 먼저 올라가 힘껏 싸우니 발사(發射)하면 적중(的中)하지 않음이 없었다.
한 사람의 왜장(倭將)이 있다가 그들의 병사(兵士)가 패(敗)함을 보고 성(城) 아래로 투신(投身)하려고 하기에 공(公)이 칼을 뽑아 추격하여 목을 베었더니 바로 적(賊)의 명장(名將)인 법화(法化)이었다. 이에 정천리(鄭千里) 및 사죄인(死罪人)으로 하여금 쌓은 섶[나무]에 불을 놓게 하였더니, 불의 열기(熱氣)가 바람같이 급하였고 마현군(馬峴軍)도 일시(一時)에 재와 모래를 뿌리니 성중(城中)이 혼미하고 어둡자 적(賊)은 크게 어지러워 법도를 잃어버리고 동남문(東南門)으로부터 다투어 나오기에 공(公)은 여러 장사(將士)를 거느리고 협공(挾攻)하며 나옴을 따라 목을 베니 적(賊)은 궁핍하고 움츠리며 혹은 명월루(明月樓)를 따라 물에 투신(投身)하기도 하였고, 혹은 스스로 서루 짓밟히고 깔려서 죽은 자를 가히 모두 기록할 수 없었으며 한 사람의 왜적(倭賊)도 다행히 면(免)한 자가 없었다. 해가 저물게 되자 각자가 진지(陣地)를 파하고 병사(兵士)들을 쉬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김윤국(金潤國)이 떨어진 사졸(士卒) 四十명을 거느리고 겁림원이 허락하였더니 이날 밤 윤국(潤國)이 의진(義陣)이 적의 목을 벤 것과 그리고 노획한 잡물(雜物)을 모두 기록하여 몰래 박진(朴晋)에게 보고하며 스스로 자기의 공(功)이라고 하였으니 대개 윤국(潤國)은 난이 일어날 초기에 성(城)을 버렸던 죄(罪)로서 바야흐로 나포(拿捕)하라는 어명(御命)이 있었기 때문에 공(功)을 빼앗아 속죄(贖罪)하고 싶었던 것이며, 당시 박진(朴晋)은 안동(安東)에 있다가 첩보(捷報)를 보자 역시 자신이 지휘(指揮)하였던 것처럼 장계(狀啓)를 올렸던 것이다.
이로서 박진(朴晋)은 품계(品階)가 더하여졌고, 윤국(潤國)도 죄가 사면(赦免)되었으며, 권응수(權應銖)와 한척(韓倜)과 조윤신(曺胤申) 등도 모두 이것으로서 직위가 승급되었으나 공(公)은 홀로 참여하지 못하였다.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시끄러워져 박진(朴晋)의 면전(面前)으로 나아가서 힐책(詰責)하고자 하는 자가 있기에 공(公)이 말씀하시기를 『말하지 말아라. 나는 오직 힘을 다하여 적(賊)을 토벌(討伐)하였을 뿐이니라.』하셨다.
八월 초(初)에 비안(比安)과 용궁(龍宮)의 적(賊)을 진격(進擊)하여 크게 쓰러트렸다. 당시 안동(安東) 이상의 적(賊)은 모두 물러가 상주(尙州)에 주둔(駐屯)하였고, 그들의 남은 잔당(殘黨)은 흩어지고 떨어진 자가 오히려 양쪽 읍(邑)을 점거하고 폭력으로 빼앗음이 비유할 수 없기에 공(公)이 가볍고 예리한 군사를 선발하여 거느리고 급히 쫓아가서 돌격하니 죽고 부상한 자가 매우 많았다.
왕세자(王世子)의 교유서(敎諭書)를 받들어 열람하고 눈물을 뿌리며 대중(大衆)에게 맹세하였다. 교유서(敎諭書)에 간략하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이 왜구(倭寇)는 하나의 하늘을 함께 일 수가 없고, 만세(萬世)토록 가히 잊을 수가 없노라. 우리의 종묘사진(宗廟社稷)은 언덕과 계곡에 쓰러졌고, 우리의 승려(乘輿)는 완전히 들어났으며, 우리의 침원(寢園)은 비린내가 나고, 우리의 도읍(都邑:서울)과 시골은 잿더미가 되었으며, 우리의 조종(祖宗)과 수백년(數百年)의 적자(赤子)는 썩어 문드러졌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문득 삶을 잃어버렸네. 창을 찾아서 베고 새벽에 도달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니 아, 나의 장사(將士)여! 누군들 부모(父母)가 없겠느냐만은 이끌어 유지하고 받들어 부지하며 그 수(壽)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으니 역시 마땅히 가정이 있었으며 죽어서나 살아서나 부지런히 노력하며 자네와 더불어 말을 이루었으며, 형제(兄弟)간에는 우애(友愛)로워 손과 같고 발과 같았네.
상란(喪亂)이 넓고 많아 가정과 국가가 서로 가라앉아 혹 창과 칼의 화(禍)를 입어 들녘의 잡초를 기름지고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몹시 어지럽고 어수선하여 그것이 매우 슬프고 참담한데 원수를 갚으려는 일념(一念)은 숨을 한 번 쉬거나 밥을 한 그릇 먹는 사이라도 어찌 잊을소냐? 시월(時月)이 덧없이 흘러 해도 또한 저물어지네. 아! 너희들의 마음이 있음을 내가 헤아리니 창을 잡고 정벌(征伐)에 종사(從事)하며 피가 흘러 얼굴을 씻고 울음을 마시며 기회를 타고 분발(奮發)하여 원수인 이 적(賊)과 더불어 함께 살지 않았네. 내가 천명(天命)을 받아 보고 어루만지니 편안하게 살 겨를이 없었으며, 너희들과 더불어 함께 호응하며 깎아서 평정하기를 원하였네.
아! 인자(仁者)는 어버이를 버리지 아니하고 의자(義者)는 임금을 뒤로하지 않음은 《춘추(春秋:역사책)》에 백세(百歲)의 법을 밝혔으니 복수(復讐)함이 중대함이 되나니라. 충(忠)과 효(孝)는 두 가지의 도(道)를 이루지 않나니 기이(奇異)한 공(功)을 일찍 거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시(敎示)하노니 마땅히 모두 알리라.』라고 하셨다.
공(公)이 열람하고 곧장 눈물을 뿌리면서 말씀하시기를 『군부(君父)의 원수는 신자(臣子)로써 뼈에 새겨야 할 바이거늘 하물며 교유(敎諭)를 내림이 이와 같으니 무릇 우리의 장사(將士)들은 더욱 감히 힘을 하다여 국가에 보답하지 않을소냐?』라고 하셨다.
二十一일에 경주(慶州)의 적(賊)을 공격하여 서천(西川)에서 싸웠다. 이날 밤에 적(賊)이 후퇴하여 서생포(西生浦)에 둔(屯 : 陣)을 쳤다. 군사를 적진하여 안강현(安康縣)에 이르니 박진(朴晋)과 권응수(權應銖)와 박의장(朴毅長)도 또한 병사(兵士)를 거느리고 와서 모였다. 성(城)을 점거하고 있는 적(賊)을 토벌하기로 도모(圖謀)하고 공(公)이 여러 군사(軍士)와 더불어 곧게 서문(西門)을 부딪치니 적(賊)은 동문(東門)을 따라 도망하여 흩어졌다.
의병(義兵)은 북을 치며 앞으로 몰아가니 점심 때에 적(賊)이 뒤에서 크게 이르자 성중(城中)이 떨치고 두려워하며 다투어 서문(西門)을 따라 나가기에 공(公)이 말씀하기를 『옛날 주아부(周亞夫)는 하여금 서북(西北)을 대비하여 온전함을 얻었나니 지금 군중(群衆)의 정(情)이 와해(瓦解)되어 비록 능히 그칠 수 없으나 만약 서문(西門)으로 나가면 반드시 적(賊)의 손에 떨어지리라.』라고 하고, 채찍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 동문(東門)으로 뛰어 나가니 잠시 뒤에 적(賊)이 과연 달려나와 뒤에서 습격하자 서천(西川)에서 싸우다가 박진(朴晋)의 군사가 군율(軍律)을 잃고 궤멸(潰滅)되어 영천(永川)의 의사(義士)인 최인제(崔仁濟), 정석남(鄭碩男)등 十七인이 모두 전사하였다.
공(公)은 조성(曺珹)과 신준룡(辛俊龍)과 이번(李蕃)과 정천리(鄭千里)와 그리고 가동(家童)과 군인(軍人) 수백명(數百名)을 거느리고 다시 진군(進軍)하여 죽을 각오로 싸우며 진천뢰포(震天雷砲)를 어지럽게 발사(發射)하니 적(賊)의 전사자(戰死者)도 또한 많았다. 이날 밤에 남은 적(賊)은 서생포(西生浦)로 도망을 갔으니, 그제서야 영천(永川)과 경주(慶州)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강좌(江左)의 일로(一路)rk 비로소 온전함을 얻게 되었다.
九월에 자인(滋仁)과 밀양(密陽)과 양산(梁山) 등의 곳에서 적(賊)을 추격(追擊)하였다. 군사(軍士) 천여명(千餘名)을 거느리고 열군(列郡)을 달리고 달리며 적(賊)을 보면 문득 무찌르니 향(向)하는 바에 앞이 없었다.
二十一년 계사(癸巳 : 一五九三) 공(公)이 四十一세(歲)임. 봄에 비안현감(比安縣監)에 제수(除授)되었다. 당시 비안현(比安縣)에 수령(守令)이 없기에 도신(道臣 : 觀察使)이 계문(啓聞)하여 공(公)에게 임시로 현감(縣監)의 임무를 보도록 요청하였다. 비안현(比安縣)은 적(賊)의 길목 요충지(要衝地)에 있었으므로 병화(兵禍)를 더욱 혹심(酷甚)하게 입어 공무(公務)와 사무(私務)가 텅텅비었던 것이다. 공(公)이 임지(任地)에 다달아 마음을 다하여 구분함이 모두 조리(條理)가 있으니 한 지경(地境)의 사민(士民)이 장성(長成)으로 여기며 의지하며 점점 생업(生業)에 안주(安住)하였다.
五월 四일에 선략장군(宣略將軍)과 훈련원(訓練院)의 첨정(僉正)에 제수(除授)되었다. ○六월 八일에 울산(蔚山)으로 달려가 태화진(太和津)에서 싸웠다. 돌격장(突擊將)으로서 전쟁에 달려가 종일(終日)토록 힘껏 싸워 죽인 것이 상당하였고, 자신도 십여 곳에 찔림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전투(戰鬪)를 독려하기를 마지않으니 적(賊)은 사기(士氣)가 두려워하여 물러갔다.
七월 十八일에 중훈대부(中訓大夫) 예천군수(醴泉郡守)에 제수(除授)되었다. 본군(本郡 : 醴泉郡)은 여러 차레 병화(兵火 : 전쟁)를 겪었고, 겸하여 여역(癘疫)으로 젊어서 죽는 자와 사방(四方)을 떠돌아다니며 굶어죽으며 치하(治下)로 와서 먹는 자가 수만명(數萬名)에 이르렀으나, 공(公)은 좌측으로는 군사(軍士)들의 먹일 것을 공급(供給)하고 우측으로는 구휼하는 정치에 응(應)하느라고 마음을 태우고 생각을 수고롭게 하느라 잠자리와 식사도 거르면서도 고생으로 여기지 않으니 이번(李蕃) 등이 그가 식사는 적게 하고, 일은 번거로움을 매우 염려하자 공(公)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순국(殉國)하는데 무슨 수로고움이 있으랴!』라고 하셨다.
윤(閏) 十一월에 보공장군(保功將軍)과 경상좌도(慶尙左道)의 병마우후(兵馬虞侯)에 제수(除授)되었다. 날마다 병사(兵士)를 단련시키고 무술(武術)을 강론(講論)함으로서 일을 삼으며 빈틈없고 조리가 정연하며 은밀하고 치밀하니 병사(兵使 : 兵馬節度使)가 매우 칭찬하였다.
二十二년 갑오(甲午 : 一五九四) 공(公)이 四十二세(歲)임. 二월에 상(上 : 王)으로부터 무과(武科)에 급제(及第)하여 관직에 오를 것을 권유받았다. 옥각대(玉角帶) 하나와 은환도(銀環刀) 하나를 하사(下賜)하시며 총애(寵愛)함이 특이하셨다.
三월에 순찰사(巡察使)인 한효순(韓孝純)과 더불어 당교(唐橋)에 주둔(駐屯)하던 적(賊)을 격파(擊破)하였다. 당시에 적(賊)이 천병(千兵 : 中國인 明나라 兵士)에게 물리치는 바가 되어 조령(鳥嶺 : 새재)을 넘어 당교(唐橋)에 머물며 주둔하였고, 무리도 만여명(萬餘命)이나 되었다. 한효순(韓孝純)이 공(公 과 더불어 약속하며 성세(聲勢)가 서로 통하니 습격할 계획을 하기에 공(公)이 제지(制止)하며 말씀하시기를 『당교(唐橋)는 막히고 험난한 곳이 많으니 가볍게 침범함은 옳지 않으며, 병사(兵士)로서 그 요해처(要害處)를 막고 왕래(往來)하는 세력을 끊으면 반드시 능히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셨더니 한공(韓公)이 기이하게 여기며 그 꾀와 같이 과연 밤을 틈타서 가만히 도망하기에 추격(追擊)하여 크게 격파하였다.
六월에 질병(疾病)으로서 향리(鄕里)로 돌아왔다. 오랫동안 병진(兵陣) 가운데 있으며 피로와 초췌(憔悴)함이 질병(疾病)으로 이루어져 이때에 이르러 들것에 실려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번(李蕃) 등이 들어가서 살펴보니 기운이 미약(微弱)하여 능히 말하지는 못하였으나 입 안에서 중얼거리는 말이 모두 적(賊)을 토벌(討伐)하여 국가에 보답(報答)하는 일이었다.
질병(疾病)이 급하자 일기(日記)를 가져다 불태우라고 명(命)하셨다. 정녕(鄭寧) 등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전후(前後)의 일기(日記)를 가지고 오너라. 나는 후일(後日)에 요행(僥倖)을 바라는 자가 이것으로서 입에 핑계삼을까 두렵구나.』라고 하시고는 드디어 명(命)하여 불태우게 하였다.
八월에 침실(寢室)에서 돌아가셨다. 부고(訃告)가 나가자 원근(遠近)의 사우(士友)들이 신위(神位)를 위하여 서로 조문(弔問)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저자 거리의 남녀(男女)도 눈물을 흘리기에 이르렀다. ○호수공(湖叟公)이 달려와서 다달아 통곡하고 몸소 자신이 염습(殮襲)과 빈소(殯所)와 광중(壙中)의 도구(道具)를 모두 경기(經紀)하였다. 순찰사(巡察使)인 한효순(韓孝純)이 소문을 듣고 놀라고 통곡하며 곧장 임금님에게 장계(狀啓)를 올리니, 상(上)이 그의 충성과 부지런함을 가엽게 여기시며 크게 상심(傷心)함과 애도(哀悼)함을 더하셨고, 특별히 통정대부(通政大夫) 병조참의(兵曹參議)를 추증(追贈)하셨다. 이 달의 二十九일에 모월(某月) 모일(某日)에 삼귀동(三龜洞) 자좌원(子坐原)에 장례(葬禮)를 모셨다. 선영(先塋)의 무덤을 따라 간 것이다.
三十三년 을사(乙巳 : 一六O五) 四월 十六일에 선무원종공신(宣務原從功臣) 이등(二等)에 녹훈(錄勳)되었다. 녹권(錄券)을 반포하여 하사(下賜)하였다.
三十七년 광해군(光海君) 원년(元年) 기유(己酉 : 一六O九) 三월 일에 가선대부(嘉善大夫)인 호조참판(戶曹參判)과 의금부(義禁府)의 동지사(同知事)도 겸하여 추증(追贈)되었다. 도신(道臣)이 장계(狀啓)로 요청하여 증직(贈職)을 받았음.
四十八년 병신(庚申 : 一六二O)에 가장(家將)이 완성(完成)되었다. 손자인 이호(以頀)가 지었음.
숙종대왕(肅宗大王) 四十五년 기해(己亥 : 一七一九)에 행장(行狀)이 완성(完成)되었다. 참봉(參奉)인 정만양(鄭萬陽)이 지었음.
영조대왕(英祖大王) 三十八년 임오(壬午 : 一七六二)에 묘갈명(墓碣銘)을 완성(完成)하였다. 좌랑(佐郞)인 이상정(李象靖)이 지었음.
三十九년(年) 계미(癸未 : 一七六三)에 유사(遺事)를 완성하였음. 오세손(五世孫)인 제(梯)가 지었음.
五十년(年) 갑오(甲午 : 一七七四)에 전(傳)이 완성되었음. 참판(參判)인 목만중(睦萬中)이 지었음.
정조대왕(正祖大王) 원년(元年) 정유(丁酉 : 一七七七)에 도내(道內)의 사림(士林) 통문(通文)을 일제히 발의(發議)하여 제향(祭享)을 올리자는 의논을 시작하였고, 본향(本鄕)의 장보(章甫)들이 창대(昌臺)에 서원(書院)을 경영하여 건립(建立)하였음.
十년 병오(丙午 : 一七八六) 十二월 기사일(己巳日)에 위판(位版)을 창대서원(昌臺書院)에 봉안(奉安)하였다. 오세손(五世孫)인 제(第)를 배향(配享)하였음.
금상(今上) 六년 기사(己巳 : 一八六九)년에 묘지명(墓誌銘)을 완성(完成)하였다. 좌의정(左議政)인 유후조(柳厚祚)가 지었음. 묘표(墓表)도 완성하였음. 감역(監役)인 이만각(李晩慤)이 지었음.
광복후(光復後) 十二년 병신(丙申 : 一九五六)에 서원(書院)을 시내(市內)의 과전동(科田洞)으로 옮겨서 건립(建立)하였음.
四十二년 병인(丙寅 : 一九八六)년 三월 일에 도내(道內)의 사림(士林)이 통문(通文)을 일제히 발송하여 당시 제향(祭享)을 올렸음. 오세손(五世孫)인 간(榦)도 추가(追加)로 배향(配享)하였음.
동년(同年) 월일(月日)에 상량문(上樑文)을 완성(完成)하였음. 김해(金海) 허복(許鍑)이 지었음.
동년(同年) 월일(月日)에 기문(記文)도 완성(完成)하였음. 광주(廣州) 이채진(李埰鎭)이 지었음.
경진(庚辰 : 二 OOO) 정월(正月) 초일일(初一日) 서원(書院) 강당(講堂) 화재(火災)로 소실(燒失)되었음.
임오(壬午)년 一월에 상량문(上樑文)을 완성(完成)하였음. 합천(陜川) 이상학(李相學)이 지었음.
계미(癸未) 三월에 강당(講堂) 동재(東齋) 문숙(門塾 : 대문과 문간방)을 중건(重建)하였음.
동년(同年) 三월에 기문(記文)도 완성(完成)하였음. 진성(眞城 : 현 진보) 이동은(李東恩)이 지었음.